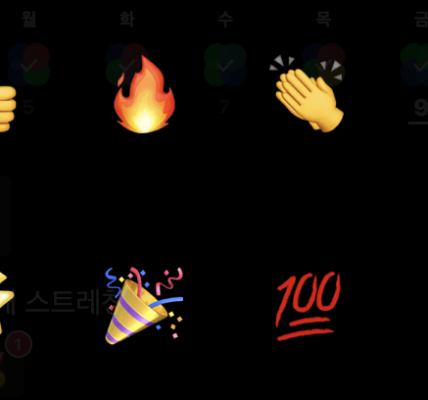호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w 창귀(안예은)
혼자서 밤길을 걷는 이유가 특별히 ‘겁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사람은 애초 야행성 동물도 아니고, 조명 없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가청주파수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다. 냄새를 아주 잘 맡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무슨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다고 밤길을 혼자서 걸을까. 그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지. 물론 그렇게 손쉬운 사냥감이 제 활동 시간대도 아닌 때에 막 돌아다니면 야행성 포식자에게는 아주 신이 날 일이다.

올해로 스물하나가 된 청년은 범을 잡겠다 거드럭대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는 것이므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창귀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른 이를 범에게 바치고 본인은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 만만인 것도 사실이다. 범을 잡겠다 거드럭댔다는 이야기로 봐선, 범이 그에게 달려들었다기보단 그가 범을 찾아 나선 것에 가까웠을 터다. 어쩌면 그도 제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을지도 모른다. 화승총은 어떻게 다루는지, 화약을 재고 철환을 넣어 짐승을 향해 겨누는 그런 기술들.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를 뜯어말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창귀가 되어버렸다면 어떨까.
이 사회 초년생은 그러나 압도적인 권력에 희생된 뒤, 그 권력의 하층을 구성하는 중간착취자가 됐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또한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산신의 이빨 아래 그렇게 강요를 받은 것이다. 권력은 창귀를 향해, 다른 희생자를 대령하지 않으면 ‘해방’을 줄 수 없노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가 말하는 ‘해방’이 진짜 ‘해방’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개 창귀가 그것을 따지기에는 그가 가진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결국 착취의 고리가 한 뼘 더 나아간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수탈의 구조.
나는 올해로 서른넷이 된 청년인데, 돈을 벌겠다 거드럭대다가 자아를 잃었소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정병원을 나설 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산신의 이빨은 몸에 더욱 깊이 박힌다. 고통은 어깨춤이 되어 덩실, 더덩실,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된다. 무산자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얼씨구 좋다, 어절씨구 좋다,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결국 재주는 창귀가 부리고 배는 범이 채운다. 그러니, 어디 한 번 무꾸리를 해볼까. 이런 미천한 명줄이 언제고 이어질지.

더 아득한 사실은, 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무 사이에는 웅신님이, 연못 바닥에는 수살귀에, 벽공 너머에는 불사조가 있고, 나그네의 뒤에도 도깨비가 서서 퇴로를 막고 있다. 운에 따라선 그 도깨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를 열어 카페인을 선물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언제나 공유경제의 끝은 파멸이었다. 어쩌면 나그네를 카페인에 중독시켜 커피를 들이켜야만 두통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창귀는, 피할 수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유형의 공포를 상기시킨다. 이것을 타파할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당연히 범을 때려잡는 것이다. 스물하나의 그저 거드럭대기만 하던 청년이 아니라, 세 발짝에 한 발을 쏘는 관동포수라거나 장팔사모처럼 긴 창을 젓가락처럼 다루는 범 사냥 전문가 착호갑사라거나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도 단신이 아니라 적어도 너댓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역수칙을 가뿐히 위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된 ‘도태’다.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맞게 걷고 있는지도 모를 터다. 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억지로 뭘 하다가 차세대 창귀가 되어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내 템포를 맞춰가며 내 동굴 안에서 밖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는 것은 현대의 무산자들은 이제 대충 다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홀로 봄’을 나는 것이었다. 봄이 오고 있어도 겨울잠을 마저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천지가 개변되지 않았는데 봄이라? 그게 산신의 기만이라면 어쩔 텐가. 밤의 가운데 멍하니 서서 머리나 몇 번 긁적이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달고나커피나 휘젓다가 미쳐버리고 해운대 방파제에서 술판을 벌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천년만년 갈 수는 없다. 결국 고립은 ‘연대의 상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다음번의 창귀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다시 한 명의 다른 나그네가 범에게 붙잡히고 말았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돕지 못해서, 내가 범을 잡지 못해서,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야. 자본주의는 무산자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업이 다해 뒤집힐 날도 올 것이다. 창귀 후보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거나, 화가 머리 끝까지 솟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죽창으로 범을 찌르거나.
@Bokthe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