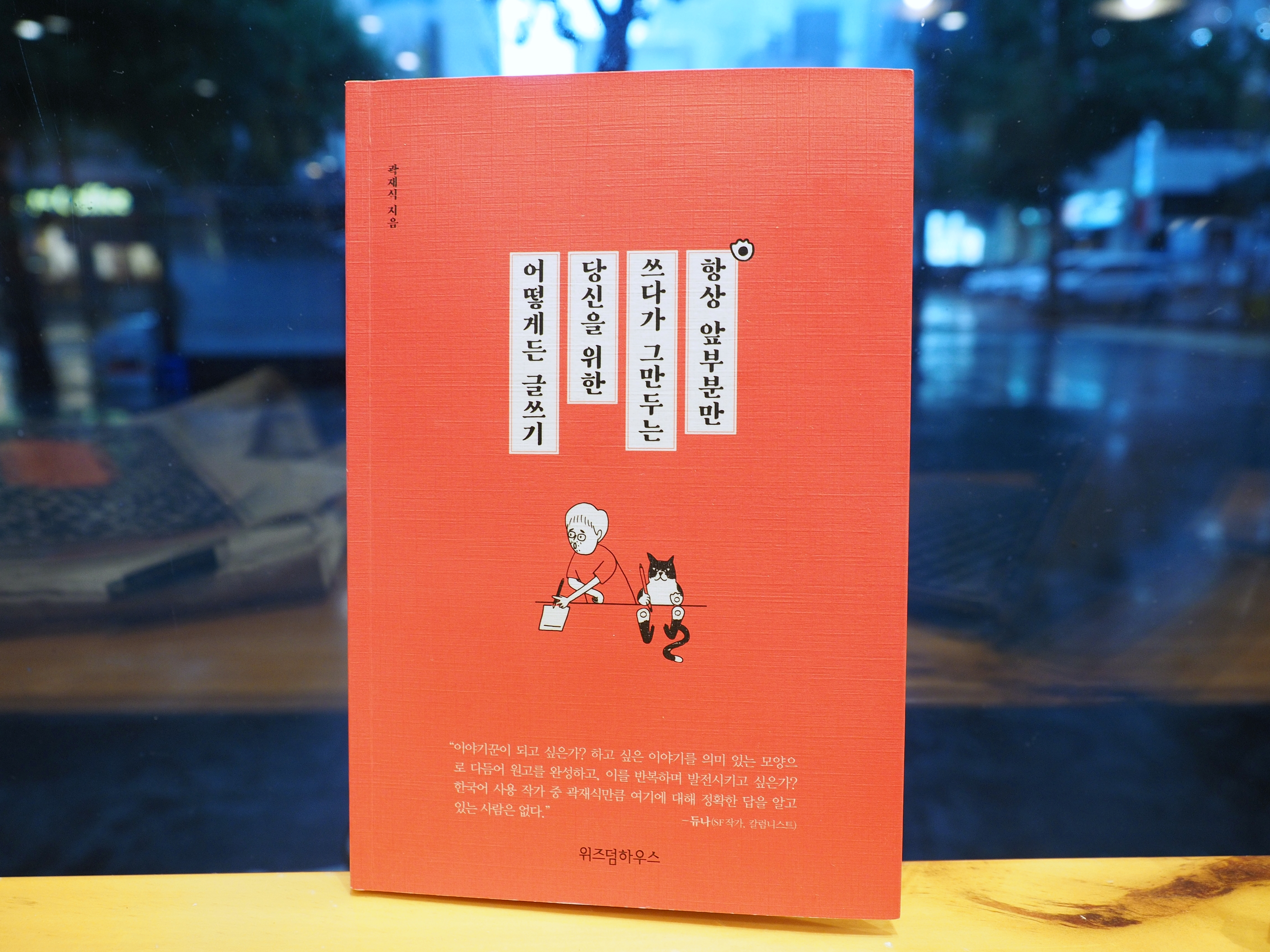서울, 네 해, 네 번째 퇴사, 그리고 어영부영 다섯 번째 직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하던 그 일주일 동안 가장 유용했던 애플리케이션(앱)을 꼽으라면 ‘캔디크러시 소다’가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오래 전에 하다가 지겨워져서 접었었는데, 최근 다시 시작해 한 달여 동안 벌써 수백 개의 레벨을 깼다. 심심한데 딱히 할 것은 없고, 그런데 시간은 남아돌고, 그렇다고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할 만한 기운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게임일 것이다. 손가락 움직일 기력만 있으면 대충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본디 사람이 치밀하거나 계산이 빠르거나 하지를 못해서, 캔크소 같은 퍼즐 게임에 능한 편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탕 몇 개 옮겨서 없애다 보면 턴 수가 전부 소모돼서 하트를 날리기 마련. 복귀할 무렵(오백 몇 정도였던가?)엔 대체로 난도가 무난했는데, 레벨이 1000을 넘어서니 이젠 순전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판이 자꾸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트를 전부 소모하고 황망하게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다가 그동안 모은 특수캔디 부스터들을 잔뜩 동원해서 넘어가곤 하니 어느덧 1420이다.
부스터만 많이 쓴다고 저절로 깨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법. 몇 번을 실패했는지 세어 보지도 않았지만, 실패하면, 특히 ‘한두 턴만 더 있었다면 깰 수 있었을 텐데!’ 할 만한 경우에는 정말 오기가 머리끝까지 뻗친다. 공략에 실패할 때마다 나오는 “다음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는 메시지가 어쩐지 나를 놀리는 것 같다가도, 그래도 응원해 주는 게 어디냐 싶다가도, 아무튼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 혼자서 이상한 개똥철학적 고찰에 빠져들고 만다. 그렇게 하나씩, 어영부영,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사는 것도 이렇게 어영부영,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양이다. 내가 연차만 쌓았지 무슨 전문성을 오랫동안 갈고닦은 것도 아니고 타고난 엄청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저 하루하루 일을 머리 쥐어뜯으며 하다가 보니 어느새 십 년도 훨씬 더 전부터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예정)도 다 해본다. 치밀하게 계산된 인생계획 같은 것은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다. 사실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도 같다.
후임자와 팀원들을 위해 최대한 세세하게 매뉴얼(이라기보단 내가 일을 이렇게 해왔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한 줌 정도 되는 짐을 들고 나왔다. 모처럼 생긴 쉬는 시간, 본가에 다녀왔다. 남부의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가 있는 며칠 동안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아마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 이 시간을 또 그리워하겠지. 그래도 어영부영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써먹을 부스터는 없지만.

@Bokthe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