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디 늙은 카메라의 마지막 필름 한 롤 /w Fujica 35-SE
불도에 뜻이 없는 이상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겉멋’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이 많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겉멋’만 든다고 해서 딱히 나무랄 일인가 싶기도 하다. 굳이 낡은 거리계 연동식(RF) 카메라를 들인 것은 순전히 내 ‘겉멋’ 욕구 때문이었다. 캐논 EOS-1이나 자이스 이콘 Contessa LKE 구매보다 한참 전의 일이다.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니 로버트 카파니 ‘매그넘’이니 하는 이름들을 들먹일 것도 없다. 단지 일상 속 ‘결정적 순간’을 노리려고만 한다면야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 내장 카메라가 최고겠지만,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니다. 센서나 렌즈 성능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가장 큰 것은 일종의 사용자경험(UX)과 관련한 문제다. 뷰파인더가 만들어 보여주는 상, 렌즈의 초점을 조절하면 따라 움직이는 뷰파인더 내 이중상, 왼손으로 조작하는 조리개 링의 탁탁 끊어지는 맛,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젖히는 필름 감기 레버의 장력, 필름실 뚜껑 틈새를 비집고 흘러나오는 필름 특유의 그 냄새, 그리고 셔터가 닫히고 열리는 기계적 움직임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소리까지. 폰카가 흉내 내지 못하는 그 경험이야말로 ‘겉멋’의 완성이다.

1959년 발매… 평범한 기능,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
후지카 35-SE는 1959년에 발매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 필름은 평범한 135판을 쓴다. 셀렌 노출계를 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노출 조정은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한다. 신기한 것은, 조리개 조절 부분과 셔터속도 조절 부분이 연동돼 있어 둘 중 하나를 조작하면 다른 하나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이다.
당연히 초점 조절도 수동이다. 렌즈는 초점거리 45mm에 조리개 개방값 F/1.9 상당. 렌즈의 크기를 놓고 보면 상당히 밝은 편이다. 반면 셔터속도 한계는 1/500초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이 시절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조리개 밝은 렌즈의 장점을 100%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노출과 관련된 모든 조작계는 렌즈 경통에 달려 있다. 초점 조절 기능은 렌즈 경통이 아니라 오른손 엄지가 닿는 부분에 다이얼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선지, 대개는 이 자리에 있는 필름 감기 레버가 몸통 아랫면에 있다. 이 물건이 나오던 때는 카메라의 ‘일반적인’ 구조가 자리 잡기도 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낯설 만도 하다. 앞서 나온 포익틀렌더 ‘비테사 L’의 구조를 모방한 듯도 한데, 솔직히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다. 익숙해지면 편리해질까? 그건 모르겠다. 나는 끝내 이 카메라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 물건을 받아들고 나서 받은 첫인상은 ‘예쁘다’였다. 직사각형으로 절도 있게 다듬어진 몸통이 은빛으로 은은하게 빛났다. 무게가 꽤 있는 데다 굴곡이 없어 한 손으로 쥐기에는 불편했지만, 어쨌든 카메라는 예쁘면 절반은 된 것이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였다. 필름 감기 레버가 넘어가질 않았다. 이게 작동이 돼야 필름을 감거나 셔터를 닫거나 할 텐데, 실사용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렌즈 경통의 노출 관련 조작계의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감도값을 설정해 두면 조리갯값과 셔터속도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게 왼손으로 돌리면 제멋대로 움직이다 말다 했다. 뭐지? 분명 실사용품이랬는데? 판매자에게 항의할까 하다가, 그냥 고쳐서 쓰면 되지,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귀찮기도 했고, 별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항의를 해야 했던 것 같다).

서울의 한 수리점에 맡기고 며칠 뒤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 하나는 필름 감기 레버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수리가 가능했고. 다른 하나는 셔터와 관련된 부품 몇 가지가 빠져 있어서 셔터속도 설정에 제약이 크다는 점. 이것은 수리가 불가능했다. 나야 이 기계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할 뿐. 그냥 가능한 부분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다였다.
그래도 이 예쁜 카메라를 장식으로만 놔둘 수는 없었다. 배운(=주워들은) 대로 눈 크게 뜨고 뷰파인더의 이중상을 맞추기도 했고, 또 조리개를 조이고서 대충 들고 막 찍어보기도 했다. 물론 이럴 땐 뷰파인더를 보지 않아야 그 느낌이 산다. 셔터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1/125초로 고정해놓고 조리갯값만 바꿔가며 찍었다. 물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노출이 정확히 맞은 것을 골라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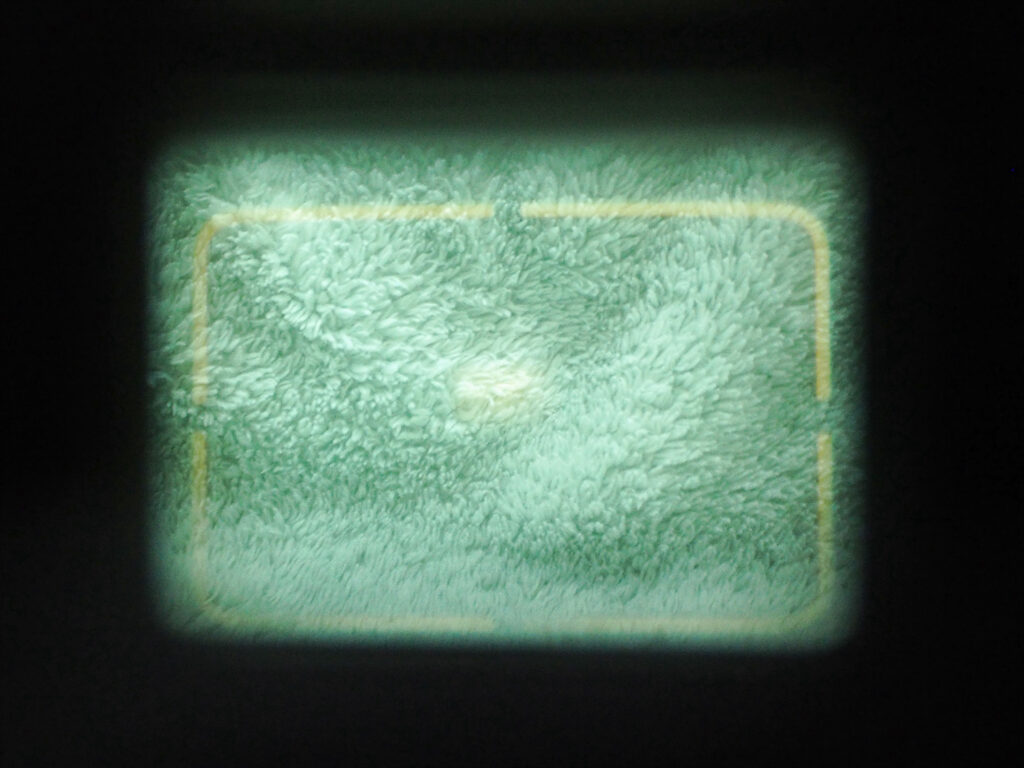
그렇게 단 한 롤의 필름만을 소화한 뒤, 내 후지카 35-SE는 장식용 소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어딜 봐도 명필은 아닌 나는 역시 붓 탓을 했고, 사 모으지 않고 그냥 뒀으면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잘 썼을 장비들을 또 다른 ‘예쁜 쓰레기’로 만드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이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면 된다.
@boktheseon









